서해성 작가가 들려주는 흐린 사진 속의 그때 (3) 1960년 서울역 압사 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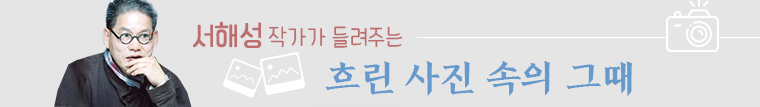

그 열차는 끝내
출발하지 못했다.
그날은 1월26일, 설을 이틀 앞둔 1960년이었다.
그날 서울엔 간간히 눈발이 떨어졌다. 새벽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내려갔고 낮에도 수은주가 영하 4도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귀향 열차가 밤을 달려 이튿날 도착할 예정인 종착역 목포 새벽 온도는 영하 7도였다. 바닷바람이 늘상 불어오는 포구라서 체감 온도는 훨씬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 열차는 끝내 출발하지 못했다. 그날은 1월26일 설을 이틀 앞둔 1960년이었다. 그때는 양력 1월1일이 신정이라고 부르는 설이었고 전통설은 그냥 음력 1월1일 구정이라고 해서 휴일이 아니었다. 국가 정책이 그러하였지 서민들이 설을 쇠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해 서울 거주자는 240만명을 헤아렸다. 59년도에는 19%, 60년도에는 16.4%로 인구가 폭증하고 있었다. 두 해 뒤인 62년도 서울 인구는 300만명(298만명)까지 치솟았다. 주소지를 서울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았다. 학생들 상당수가 그러했고 날품을 팔거나 공장 같은 데를 다니는 사람은 다수가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 향촌 정서가 강했던 그 시절에 주소 이전은 일종의 불효로 여길 정도였다.
이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서울 토박이들을 빼면 명절 때마다 고향에 돌아가야 했다. 서울에 와서 일하는 게 숫제 귀향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그때 고향은 태어난 곳이거나 주소지가 있는 곳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떠나서 죽어도 가야 하는 귀소처였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을 객지, 타관으로 여겼다. 서울은 일하는 곳이지 마음과 정을 둔 세상이 아니었다.
고향을 그토록 그리워함에도 끝없이 고향을 탈출하는 ‘탈향’(이호철의 소설, 1955)이 거듭되고 있었다. 먹고 살아야 했던 터였다. 자본과 권력, 교육과 문화혜택, 의료와 사회 서비스 따위가 극단적으로 집중되어있는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건 이미 한국인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농업은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는 개발 시대에 이르러 더 가속화되었다. 벌써 ‘서울은 만원’(이호철의 소설, 1966)이었다. 산비탈을 타고 판자촌이 끝없이 생기고 있었다.
이들이 떠나온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으로 귀향할 수 있는 교통편은 기차 말고는 거의 없었다. 고속도로가 없었기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는 게 있을 리 만무했다. 명절이면 사람들은 기차역으로 몰려들었다. 기차표를 끊고 차를 타는 과정이나 광경이 피란민들과 그닥 다르지 않았다. 서울역전 파출소에는 경찰력이 증원되었다. 전투복을 입은 경찰들은 대나무 장대를 들고 귀향객들을 줄 세우고 허락 없이 누군가 일어설라치면 예사로 머리통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기차를 탈 무렵이면 대나무는 쪼개져 있기 십상이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서울역에 운집한 채 막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형편이 넉넉치 못한 사람들이
타고 가는 한없이 느린 기차였다.
목포로 내려가는 마지막 밤 기차
완행열차였다. 호남선 601편. 22시 50분에 발차하는 목포로 내려가는 마지막 밤 기차였다. 특급, 보급, 보통, 완행으로 등급이 나뉘는 맨 하등 기차였다. 완행이란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밤새 달리는 동안 호남선 모든 정거장에 다 서고 다시 떠나는 승객 열차를 말한다. 가장 형편이 넉넉치 못한 사람들이 타고 가는 한없이 느린 기차였다. 송정리역에서 여수로 향하는 전라선으로 갈아타는 승객들도 섞여 있었다.
명절 기차를 타는 방법은 대략 이러하였다. 며칠 전부터 서울역 마당에 가마니를 깔고 기다려서 임시 매표소에서 표를 사거나 당일 일찍 나와 객차가 증편된 표를 가까스로 구하거나 했다. 완행열차에는 좌석 입석 따위 구분이 없었다. 쇠로 막아 놓은 개찰구 앞에서 모자를 쓴 역무원이 펀치를 들고 기차표에 구멍을 뚫는 개찰을 시작하면 두 손에 짐을 들고 컴컴한 백여 계단을 뛰어 내려가야 했다. 넘어지는 일은 다반사였다. 열차 승강구는 물론 기관사들이 기차를 손보기 위해 이동하는 통로인 기차 머리, 그러니까 기관차 난간에까지 사람이 들어차면 미처 열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창을 통해 몸을 밀어 넣어야 했다. 서 있을 자리도 모자라 열차 좌석 위 선반에 올라가서 누운 채 가는 사람도 흔했다.
평소보다 3배가량 많은 승객이라서
마침 조금 전에 도착한 호남선 기차에서
객차 4량을 떼어내 추가로 보충하느라
개찰은 자꾸 늦어졌다.
얼어붙은 그 겨울 계단에서 31명이 압사하고 49명이 다쳤다.
서울역에서는 그날 601편 열차표를 3,926장 팔았다. 2등칸 68장, 3등칸 3,858장이었다. 표를 사지 않은 영유아 어린이들도 거기 끼어 있었으므로 기차를 타야 하는 사람은 4천명이 훌쩍 넘었다. 기관차 뒤에 2등 1량, 3등 15량, 화물칸 1량, 군용칸 1량을 연결한 18량짜리 긴 열차였다. 평소보다 3배가량 많은 승객이라서 마침 조금 전에 도착한 호남선 기차에서 객차 4량을 떼어내 추가로 보충하느라 개찰은 자꾸 늦어졌다.
열차 출발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을 때야 11개 개찰구에서 일제히 개찰을 시작하자 귀향 선물 보퉁이를 머리에 이고 손에 든 사람들이 둑이 터진 듯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리에 앉지 않아도 괜찮지만 자칫하면 탑승 자체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승객들은 내남없이 내달리고 있었다. 역무원들은 짐을 줄래줄래 들고 있는 부녀자들이 먼저 내려갈 수 있도록 앞줄에 배려해주었다. 보퉁이를 들고 겨울옷을 껴입은 그들이 맨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승강장을 향해 내닫고 있었지만 동작이 느릴 수밖에 없었다. 계단은 군데군데 얼어 있었다. 밀지 말라는 남도 사투리가 들렸고 곧 몇몇이 넘어지더니 발자국 소리와 비명 소리가 낭자하였고, 이윽고 경찰을 찾는 애절한 소리도 들렸다.
몰려 내려오는 사람들은 계단에 쓰러진 사람들을 밟고 지나갔다. 어떤 이는 아예 등뼈가 부러져 죽었다. 얼어붙은 그 겨울 계단에서 31명이 압사하고 49명이 다쳤다. 죽은 이들 다수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듯 힘이 약한 여성들이었다. 감식이 어려웠던 때라서 종로에서 제과소 직공으로 일하다가 고향인 고창으로 귀향하지 못하고 죽은 청년에게 서로 다른 유족이 나타나기도 했다. 사망자들은 이튿날 바로 벼락치기 합동 초상을 치렀다. 사고를 수습하면서 서울역 역장과 여객주임 둘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되었다가 역장은 무죄, 여객주임은 금고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현장에 떨어진 물건은
신발과 사과, 배가 가장 많았다.
흩어진 신발은 고향으로 가지 못한 흔적이었고
사과와 배는 선물이자
차례상에 올릴 제수품들이었다.
그날 1월26일 하루 동안 철도청은 전 구간에서 19만 6,697명을 운송했다. 화물운송료를 포함하여 수입이 1억 4,799만 1,686환이었다. 한국철도 역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날이었다. 그때까지 압사로 사망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날이기도 했다. 사고 현장에 떨어진 물건은 신발과 사과, 배가 가장 많았다. 흩어진 신발은 고향으로 가지 못한 흔적이었고 사과와 배는 선물이자 차례상에 올릴 제수품들이었다. 사고로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들 중 귀가하지 않고 기다린 2천3백여명은 서울역에서 다음날 0시, 새벽 2시 발차하는 임시열차를 타고 기어이 고향으로 내려갔다. 압사까지 딛고 돌아가는 끈질기고도 지독한 귀소 본능이었다. 그 뒤로도 기차역을 포함한 압사 사고는 잊을 만하면 다시금 재현되었다. 마침내 이태원 골목까지.
27일 서울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고 마른 눈이 내렸다. 압사당한 사람들 뼛가루처럼. 서울역 건물은 거기 선 채 아직 묻고 있다. 국가는 무엇을 하는 존재이고 무엇을 기억하는가.